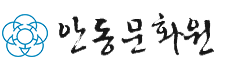성황당 부엉이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안동문화원
- 작성일
본문
안동시 일직면 마을 곁을 맑게 흘러내리는 조그만 내를 거슬러 올라가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오랜 옛날 이 고목으로 인한 큰 걱정거리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었다.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즐거웠던 달불놀이도 끝나고 모두들 피곤하게 잠자리에 든 삼경쯤 되어서 난데없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느티나무 있는 곳에서 들려왔다. 부엉이 소리는 구슬프고 처량했으며 으스스한 기분을 자아내어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불쾌한 듯 가슴을 파고드는 부엉이 울음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다.
다음날 밤부터 부엉이는 울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 소리를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해 마을 사람 하나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백방으로 약을 쓰고 의원을 대었지만 허사였다. 마을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흔히 있을 수 있는 불치의 질병쯤으로 생각하고 그 해를 보냈다. 그 다음해 정월 대보름이었다. 삼경이 되도록 흥겹게 하루를 보낸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를 준비하였다.
삼경이 되자 또 이전 해와 같이 그 느티나무 위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그 소리는 더욱 처량하고 간장을 후비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쫓기며 하룻밤을 뜬눈으로 보냈다. 과연 그해에 또 한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해마다 정월 대보름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불안케 했으며 꼭 한사람씩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갔다.
매년 이런 변괴가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 오면 공포에 떨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 연유를 조금도 알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막연히 매년 그 공포와 죽음을 당할 수만은 없었다.
이즈음 인근 송리동에 후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특이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후산은 친구들과 마을 정자에서 담소를 즐기고 있었다. 정자 옆 회나무가지에 참새 두 마리가 날아와 지저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던 친구 한 사람이 후산을 돌아보며 "여보게 후산 저 참새는 왜 저리 우는지 알겠는가?" 하고 농담조로 물었다. 조용히 참새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후산은 고개를 들며, "저 참새는 남후면 구암동 황씨집 마당에 있는 벼를 까먹지 못해서 저렇게 울고 있구먼." 하고 대답했다.
농담으로 그것을 물었던 그 친구는 물론 모두들 뜻밖에 그런 대답을 듣고 한편 놀랍고 한편 믿어지지가 않아 이상스런 눈초리로 후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 참새는 왜 그 벼를 까먹지 못하는가?"
하고 물었다.
이 물음에 후산은 이번에는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그 집 할멈이 긴 장대 끝에 검은 헝겊을 달아 휘휘 참새를 쫓고 있으니 어찌 까먹을 수 있나?"
하고 대답했다.
마치 보고있는 것처럼 말하는 후산을 모두들 믿지 못하면서도,
"허지만 자네가 어찌 참새 울음소리를 듣고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지 도무지 못 믿겠는 걸?"
하자 후산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못 믿겠거든 가서 보고 오게나."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심 공연한 짓이다 싶어하면서도 남후면 구암동으로 사람을 보내 알아보기로 하고 하인을 보낸 즉 얼마 후 달려온 하인의 말은 후산이 말한 그대로였다.
이렇듯 새의 소리를 듣고 그 원인까지 알아맞힌다는 후산의 이야기를 들은 원호동 사람들은 후산을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름날의 부엉이소리 때문에 겪은 고충을 설명하고 그 연유를 물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후산은 이윽고 눈을 뜨더니 별안간,
"정성이 부족하오, 정성이……"
하며 마을 사람들을 꾸중하더니 축문을 지어 내주면서,
"정월 대보름 전날 밤 삼경에 이 축문을 그 느티나무에 걸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괜찮을 것이오."
하고 일러주었다.
그 다음해 마을사람들은 1년 동안 집안에 변고가 전연 없고 인척간에도 다툼이 전혀 없는 부유한 사람을 제관으로 뽑았다. 제관은 사흘동안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고 엄동설한의 차가운 물에 온몸을 깨끗이 하였다. 대보름 전날 밤에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둘레에 높은 제단을 쌓아 집집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았다. 심신을 정결히 한 제관이 앞장서 축문을 낭독하였다.
이튿날 밤 즉 정월대보름날 삼경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밤에 과연 부엉이가 울까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은 궁금하기는 하지만 더욱 큰 조바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고요한 적막을 깨뜨리고 "부엉"하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절망과 공포에 사색이 되었다. 그러나 단 한 번 울고 난 부엉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모두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려 느티나무에 모여들었다. 나무 밑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부엉이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 그해에 사람들은 어떤 병도 앓지 않았다. 오히려 그 외의 재난에도 마을이 지켜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해마다 제관을 봄아 정월 열나흘날 밤엔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후산이 지어준 축문을 낭독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지금도 원호리 사람들은 해마다 그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그 느티나무를 성황당 나무 또는 마을을 지켜준다는 뜻에서 "골매기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